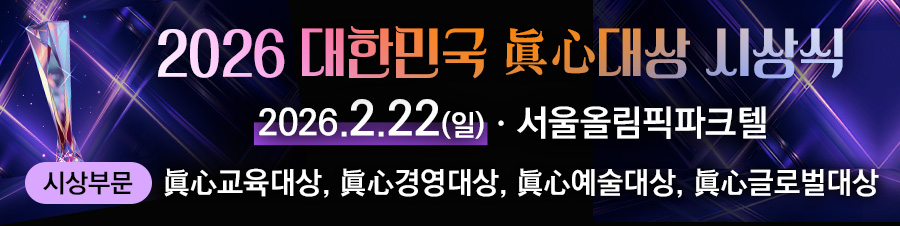이불처럼 따뜻한 것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끝도 소리 없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늘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얼마 전 양로원으로 가셔서 “여기가 하숙집 같아, 그저 살만해.” 하시던 어르신의 슬픈 소식을 접했다. 집 떠나 그곳 생활에 적응하던 불과 2주 만이다.
첫 면회 약속을 한 그날, 양로원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선산 묘지로 시공간 이동을 하셨다.
지울 수 없이 아른거리는 그 날의 광경은 이러하다.
하얀 눈 덮인 길을 오르던 검은 제복들이 멈춰 선다. 잠시 묵념 기도에 이어 찬송 소리가 잔잔히 퍼진다. 어제 입관할 때의 울부짖던 모습은 하룻밤 새 온데간데없고 차분하다. A4지 천장 정도 쌓은 두께만 한 나무 상자를 연다. 하얀 보자기가 꽁꽁 묶여있다. 면장갑을 낀 손이 보자기를 푼다. 연회색 빛 가루 한 움큼씩 잡은 주먹 손을 조금씩 펼친다. 뿌연 가루가 힘없이 떨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냉큼 삼켜버린 듯 금세 사라진다.
95년의 인생은 우리 앞에서 유유히 한 줌의 재로 떠나간다.
고생하시다가 좋은 곳으로 갔다며 안도하는 가족들이다. 바람 앞에 선 등잔처럼 휘청거리며 힘겨워하던 육체에 대한 책임감에 버겁던 짐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과 달리 나는 고인에 대한 격한 공감에 눈이 퉁퉁 붓는대도 계울음이 그치지 않아 민망하기도 했다.
이 자녀들은 고인이 되신 분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었을까? 물음이 들자 어느 겨울날, 내 기억을 더듬어 본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한동안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정신을 차렸다. 새 정신으로 깨어난 나는 평소에 아버지께서 쓰시던 일기장이 생각났다. 부랴부랴 이젠 부모님 대신, 동생이 사는 친정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다 정리해버려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가까스로 아버지께서 한자 필적으로 써 내려간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을 챙길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가계부처럼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으셨다. 당신의 이야기며 재정 기록, 자식들에 대한 염려와 때로는 나의 역사를 메모장처럼 꼼꼼하게 적으셨다. 이미 사라져 버린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손때가 묻은 흔적을 무엇이든 갖고 싶었던 기억에 씁쓸하다.
이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나름대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
장례를 마치자 유산문제로 가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모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 한다.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을 추억하는 사진이나 소중히 아끼시던 물건 등. 유산보다 관계적인 가치관과 살아생전 지혜의 말씀과 삶의 태도일 것이다.
며칠 후 주일 날, 유족들이 모두 모여 당신의 어머님이 40년간 다니시던 교회에 참석했다.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전부 참여해서 어쩌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날을 희로애락 한 교우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음식까지 대접했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부모님이 그들에게 남긴 마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
내가 그들 중 한 자녀에게 어머님은 어떤 분이었냐고 묻자 ‘이불’이라고 했다.
“멀리 해외에 있어도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요. 덕분에 제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참 따뜻한 이불이에요.”라고 한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가 또 선물처럼 다가온다.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된 것 만이 아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려는 삶으로 살아간다. 무엇을 할 것인가로 새해 계획을 빼곡히 채우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심하며 계획하는 새해, 어떠한가?

홍헬렌송귀 작가
마음공감 코칭 & 심리상담센터장
학력 : 칼빈대학교대학원(심리상담치료학,상담학석사)
경력 : 현)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 이사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상담사/ 용인시 교육지원청 학생삼담
저서(공저) : [자존감요리편 10인10색마음요리2] [시니어강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