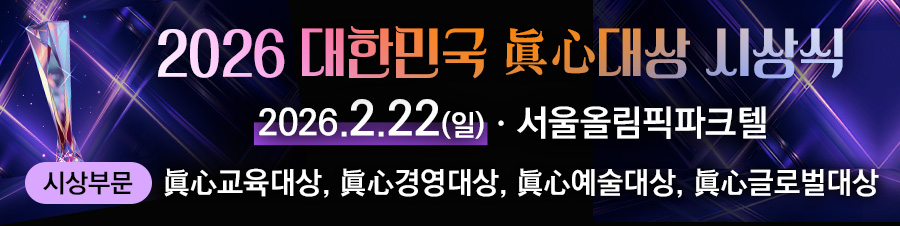폭싹 속았수다, 숨비소리
제주에 유채꽃이 4월 말에도 예쁘게 피었다. 파종을 늦게 한 때문이라니 살면서 이런 행운이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노랑과 연두색의 유채꽃 들판을 가로지르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본다. 말을 타고 유유히 걷는다. 제주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이 있는 선물같은 시간이 된다.
제주 바다는 동해바다에서 느끼는 심오한 깊음과 함께 따뜻한 여성의 숨결로 다가왔다. 바로 해녀박물관을 통해 알게 된 깊은 숨소리, 제주 해녀의 ‘숨비’를 알고 나서이다.
‘숨비’는 해녀들이 ‘물질 후 내뱉는 생존의 숨소리’라고 한다.
그것은 호흡 이상의 숨쉼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인간의 본능적 외침과 세대를 잇는 생존의 소리 같은 것이다.
이처럼 제주 해녀의 숨비 소리는 단순한 호흡만이 아니다. 그들이 깊은 바닷속을 오랜 시간 숨을 참고 물질을 마친 뒤 수면에 올라 내뿜는 거친 숨 가쁨은 현대를 사는 우리네 삶을 향한 의지와 수고에 비교 가능할까?
숨비는 자연과 호흡하며 주고받는 ‘나 여기 살았소!’라 내뱉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호흡이고, 위대한 언어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맨몸으로 잠수하고, 자연의 산물들을 자율 채취하며 조화를 이뤄낸 해녀들이 살아온 삶이다. 여성 주도적인 공동체 정신으로 연대하는 해녀 문화를 제주에서 만나고 보니 생을 향한 절규이며 비장한 노래로 들렸다. 같은 여성으로서 삶의 무게감이 애달프게 가슴에 와 닿았다.
이러한 해녀 문화는 자연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 일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전승에 위기를 맞으며 보존의 노력이 필요해서 ‘해녀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청년 해녀 양성과 기록 작업으로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 해녀들만이 가능한 ‘물질’은 동남아 해변 국가들이 해녀학교에 관심을 갖게한 이유이다. 한국 여성으로서 제주 해녀들이 생존을 걸고 살아낸 삶에 숙연해졌다.
박물관을 나오며 관광 안내 기사는 수고했다는 뜻을 담은 제주 방언, ‘폭싹 속았수다’를 빨리 발음해보라고 한다. 살아내느라 애쓴 그들에게 들려주는 ‘수고했다’는 말을 해녀의 숨소리 만큼이나 가쁘게 혀를 굴렸다. ‘수곱슴다’로 들린다. ‘속았수다‘와 비슷하게 들리는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자연스레 회자되었다. 제주 사람들의 절박한 삶의 투쟁, 그들의 말과 제주도 풍경들 그리고 상호관계를 통한 가족애를 담아낸 감동의 드라마로 기억된다.
’폭싹 속았수다‘의 인물들은 저마다의 사연들로 삶의 파도에 부딪히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해녀들의 삶과 닮았다. 매일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가족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인생, 두려움을 품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세찬 바람에 휘몰린다. 차가운 바닷속은 어둡고 힘겹지만, 해녀들은 깊이 잠수하고도 다시 올라 ‘숨비’로 살아내었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그 안에 숨 쉬는 해녀들을 떠올리면 결코 제주도가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만 없다. 제주의 바다에 품어낸 ‘숨비소리’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사랑이고. 누군가의 생명이다. 해녀문화가 만들어낸 자연과 인간을 향한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제주 해녀들이 생존을 걸고 살아낸 삶은 참으로 위대하고 고귀하다. 우리 또한 당면한 삶을 사노라면 스스로 질문해 보자.
"지금, 우리는 어떤 숨비소리를 품어 내고 있는가?“

홍헬렌송귀 작가
마음공감 코칭 & 심리상담센터장
학력 : 칼빈대학교대학원(심리상담치료학,상담학석사)
경력 : 현)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 이사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상담사/ 용인시 교육지원청 학생삼담
저서(공저) : [자존감요리편 10인10색마음요리2] [시니어강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