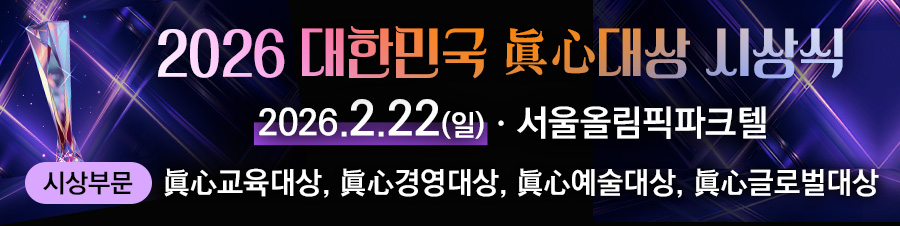외할머니의 명품명언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외할머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늘 마음속에서 인자한 미소로 지켜보고 계신다. 대부분의 어린 시절 추억은 외갓집에서의 일이다. 한량 같은 아빠와 결혼한 엄마는 식구가 많은 친정집의 부엌일을 도맡아 하면서 먹거리를 해결해야 했기에 어린 나는 늘 이모들 차지였다. 엄마는 일곱 명의 이모와 외삼촌이 둘인 십 남매 중에 셋째딸이다. 첫째였던 큰이모가 아들 둘을 낳았고, 내가 태어났으므로 난 첫 외손녀가 되었다. 그 시절에도 여자 아기의 인기가 더 좋았는지 이모들은 서로 나를 돌보려고 경쟁이 치열했고, 그만큼 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밝고 긍정적이며 자존감 높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외가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기에 마음 깊이 고마워하고 있다.
외할머니는 90세를 못 채우고 돌아가셨다. 내가 기억하는 외할머니는 항상 허리가 꼿꼿하셨고, 비녀를 꼽은 쪽 머리에, 맑은 하늘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열 남매를 키우시며 한 번도 큰소리 내거나 매를 든 적도 없었다. 막내 이모는 나와 네 살 차이였는데, 그 이유로 막내로써 마땅히 받을 관심과 사랑을 나와 나눠 가진 셈이다. 그래서였을까? 가끔 시기 질투심으로 언니 동생처럼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다. 그 무렵 외할머니께서 딱 한 번 회초리를 든 적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아플까 봐 아주 살짝 때리는 척만 하셨다. 그리고도 마음 아프셨는지 밤새도록 딸의 종아리를 주무르시는 걸 보았다. 그 모습은 철부지 손녀가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
나는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할머니 앞에서 투덜거리며 하소연한 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무심한 듯 한마디씩 툭 던지셨는데, 그 말씀은 아직도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 국민학교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뿐 아니라 선생님까지 나를 ‘시골 촌닭’이라고 놀리는 바람에 속상했던 마음을 털어놨었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껄껄껄 크게 웃으시는 할머니가 나는 원망스러웠다. 울컥한 마음에 “위로는 안 해주시고 너무 하시는 거 아녜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구들이 놀리면 나처럼 오히려 크게 웃어보렴, 그러면 친구들이 재미있는 친구네? 라며 좋아할지도 몰라”라고 말이다.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때 할머니의 처방은 재치 넘치는 유머였다는걸 깨닫게 되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초등학교 때 나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편이어서 늘 교실 뒤에 있는 <우리들의 솜씨> 칠판에 내 그림이 붙어 있었다. 미술대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당연히 내가 대회에 나갈 줄 알았지만, 선생님은 매번 반장이나 부반장에게 양보하라고 했었다. 나는 선생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많이 억울했다. 그때도 외할머니께 속상함을 하소연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려면 다른 남에게 잘 보이려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할머니의 처방은 꽤 효과가 있었다. 오랜 삶을 통해 느끼고 깨달으신 명품명언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씀들은 나의 인생철학이 되었고, 힘든 일로 방황할 때마다 길잡이가 되어 주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었다. 나도 할머니처럼 힘든 일로 속상해하는 사람들에게 멋진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지혜와 현명함을 갖추고 싶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할머니는 지금도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미소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