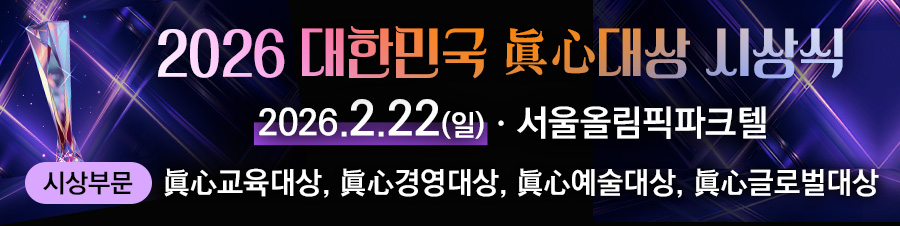시간의 주인, 식탁 철학
"인간은 시간을 지배할 때 미치도록 행복해진다.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몰입이다. 미치도록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면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
고명환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무엇에 몰입을 경험하는가?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의 틀 속에 우리는 산다.
선물 같은 하루를 평등하게 받았지만, 혹시 시간에 끌려다니거나 타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움직이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미래이고 곧 인생이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과연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는 한다. 특히 여인네들의 삼시 세끼 식사 준비를 통하여 과연 나는 내 시간의 주체로 살고 있는가이다. 시간이 ‘금’이라는 말, 곧 시간은 ‘나’다. 이는 존재의 본질이고, 당연시해야 할 것임에도 나는 없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밥상이 엄마 사랑의 근간이 되고, 아내라는 존재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내 시간을 조율해야만 했다.
결국 ‘식사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식사 준비할 때 그 노동의 대가로 타인이 행복하게 식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러할 때 그 행위는 의미가 있고 요리 준비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식사를 준비할 때면 특정한 시간표에 종속되지 않는다. 정해진 ‘점심 12시’나 ‘저녁 7시’가 아니라 내가 요리를 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곧 ‘식사 시간’이 된다. 몸도 마음도 그 리듬에 맞춰 유연하게 반응한다. 이때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주관하는 존재가 된다, 혹 식사를 거르더라도 나 자신이 시간을 관리했기에 몸도 구태의연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 식사를 기다리는 이들은 그 시간에 민감하다. 식사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 배고픔에 짜증이 올라오고 밀려드는 분노를 참지 못하기도 한다. 단순하게 배고픔의 생리적 반응만이 아닐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시간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반응이다.
나는 아이들이 분가하고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거의 매끼 하다 보니 식사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입맛이 있고, 식사 시간에 민감했다. 세끼를 정시에 제대로 차려 식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에게 맞추려 애쓰면서 점점 식사 준비가 고통스러워졌다. 아침 식사는 부담되어 거르게 되고, 점심 한 끼 정시에 먹는 것이 오히려 생체리듬에 맞았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가 스스로 요리하고, 자신의 규정대로 제시간에 식사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내 몸의 리듬과 시간도 소중하기에 여러 번 호소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자신의 리듬에 맞게 요리하고 식사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갈등은 점점 사라졌다.
이는 단지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결정권과 존중 그리고 ‘존재의 시간’을 회복하는 일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자유는 ‘자기 법칙을 세우는 능력’에서 온다고 하지 않던가. 내가 주체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일상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작은 시도는 절실하게 요구했던 나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과 연결되어 자유로운 시간이 부여되었다.
결국,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 또한 몰입을 경험한 것이다. 그는 타인이 주는 식사를 기다리는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창조자가 되었다. 요리하는 시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조율하게 되었다. 배우자인 나와의 관계에서도 관용하는 남편,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기여자가 되었다.
밥상을 대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요리하고 있는가?”

홍헬렌송귀 작가
마음공감 코칭 & 심리상담센터장
학력 : 칼빈대학교대학원(심리상담치료학,상담학석사)
경력 : 현)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 이사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상담사/ 용인시 교육지원청 학생삼담
저서(공저) : [자존감요리편 10인10색마음요리2] [시니어강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