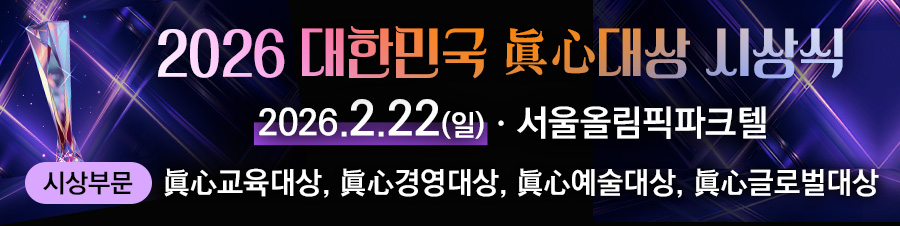물방울 속 세상
쉼을 위해 제주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친구의 부모님이 하시는 감귤밭을 찾아가던 길에 우연히 김창열 미술관을 발견했다. 내가 좋아하는 화가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화가는 물방울 그림 작품을 많이 남겼다. 처음 작가의 그림을 마주했던 때는 투명한 물방울처럼 순수했던 20대 초반이었다. 가난하던 사회 초년시절, 단풍이 예쁜 계절마다 과천에 있는 놀이공원에 있는 동물원에 들러 동심에 젖어보곤 했었다. 돌아오는 길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들러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나름의 사치를 누리곤 했었다. 그때 만난 그림 속 물방울과의 조우는 학창 시절 화가의 꿈을 키웠던 소녀의 마음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이슬방울처럼 다가왔다.
김창열 화가는 1929년 12월 24일에 태어나 2021년 1월 5일에 별세했다. 초기에는 앵포르멜 계열의 작품을 그리다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을 소재로 다루면서 ‘물방울 작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의 물방울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해외 미술계에서도 미학적 논의와 관심을 일으키며 한국 현대미술의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김창열 미술관은 제주시 한림읍 마을 안쪽에 숨어 있는 독특한 모양 미술관이다.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실, 체험형 교육실, 야외정원 등,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물방울 작품을 모티브로 빛의 중정과 각각의 방들로 구성된 독특한 건물이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애기동백나무 울타리 사이로 작은 새집이 보였다. 근처에 사는 작은 새가 휴관 일에 집을 지어 놓았다가 다음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걸 알고 떠났을 거라며 작은 새집을 내게 건네주었다. 친구는 제주에 내려와 지낸 지 10년째 나무사업을 하고 있다. 손바닥에 폭 안길만큼 작은 새집 속엔 애기동백나무 씨앗 세 개가 담겨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불은 빛의 씨앗은 조금 전에 봤던 작가의 작품에서 빛나던 물방울처럼 호기심 어린 내 눈동자를 비춰주고 있었다.
물방울 그림을 보니 2015년 시 창작 동아리 활동하면서 동인지를 만들기 위해 지었던 시가 생각난다.

봄의 칸타타
언덕에 꽃내음 달콤한 봄의 무대
어린 아지랑이의 따뜻한 손길에
새싹들 봉우리들 가득한 도시의 공원길
풀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눈길을 잡는다
여느 물방울과는 다르게 부르르 떨고 있는 녀석
자세히 들여다보니
길잃은 개미 한 마리 투명한 물방울 캡슐에 갇혀 있다
소리 없는 개미의 비명이
고막이 찢어질 듯 고통스럽다
손끝으로 캡슐을 터뜨리자 젖은 몸을 추스르는 검은 신사
감사의 인사인지 목청껏 소리를 지른다.
가까이 귀를 기울이니 아름다운 목소리의 오페라 가수였다
노랫소리에 나비도 날아와 춤추고
꽃잎이 흩날리며 무대를 장식한다.
소박한 칸타타에 흠뻑 취한 봄날 오후
새싹들 봉우리들 미소 짓는 도시의 공원길
바람이 귓불을 스친다. 육지에서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비우지 못해 남겨진 찌꺼기들이 바람에 쓸려가고 있다. 가슴에 작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답답하고 혼탁한 세상의 물방울이 제 무게를 못 이겨 떨어진다. 희망을 품은 영롱한 새로운 물방울이 맺힌다.
내가 물방울을 들여다보듯이 물방울 속 세상이 나를 내다보는 것 같다. 물방울 속 세상에서는 내가 속한 세상이 또 다른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빛을 만나면 영롱해지는 물방울처럼 더 맑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 윤미라(라떼)
경희사이버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스토리문학 계간지 시 부문 등단
안산여성문학회 회원
시니어 극단 울림 대표
안산연극협회 이사
극단 유혹 회원
단원FM-그녀들의 주책쌀롱 VJ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