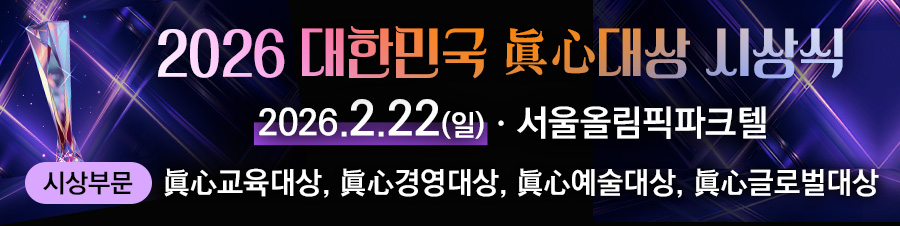집의 온기
며칠 동안 그치지 않는 업무로 인해 쉴 틈이 없었다. 온갖 서류 더미에 파묻혀 심신은 시들은 채소처럼 축 늘어진다. 이쯤 되면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이 간절해진다. 못다 한 업무 서류를 챙겨 집으로 향한다.
집 문 앞에 서서 깊은숨을 들여 쉰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다. 손이 떨리고 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내 기억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듯한 요란한 경고음만 울린다.
출근 전, 사소한 다툼으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을 남편 얼굴이 떠오른다. 아직 풀리지 않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니, 내 손이 떨렸나 보다. 힘든 마음은 열리지 않는 현관문처럼 집안으로 들어서기가 망설여진다.

“나는 내 집이 있는가?”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나선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눈이 조금씩 날린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에 손을 내밀어 본다. 보슬보슬한 눈송이가 살포시 앉는다. 느린 걸음을 멈추어, 하늘 한번 올려 본다. 집 앞 커피숍에 들어가 서류를 꺼낸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로 남편은 거의 집에 있다보니 집 안을 세심하게 챙긴다. 사소한 지적이지만 부담이 된다. 그 불편함을 마주하기 두려운 마음이 잦아지면서 나는 이방인이 되곤 한다. 그럴 때면 커피숍에서 마음 달랜다. 오늘도 오후 늦은 커피지만 그 한잔에 마음을 적시며 눈처럼 뽀얀 마음을 기대해본다.
검푸른 하늘 아래 내리는 눈은 대지에 쌓이며 이불처럼 덮고 있다.
나는 잠시 겨울 왕국의 공주가 되고, 심포니 연주를 듣는 상상의 나래를 편다.
골목의 소음도 잠재우는 고요함에 온몸이 안온함을 느낀다.
일어나 골목길을 들어선다. 신발의 깊이 만큼 푹 패는 발자국 모양이 나를 따라서 온다. 오직 나의 발자국만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뒤돌아서서 한참을 머물려 생각한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인가, 이방인인가?“
다시 현관문 앞에 선다. 번호를 누른다. ‘띠 리릭 찰칵’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린다. 살금살금 화장실을 먼저 들러 방으로 간다. 차디찬 돌침대의 전원을 누른다. 순간 빨간 불에 놀란다. 이게 웬일이지?
아침에 분명히 끄고 집을 나왔는데 의아하다. 지금 온도 37도, 평소의 35도보다 높다. 따뜻하게 이미 데워져 있다. 누가 켰을까? 이 집 주인, 남편이 켜 둔 게 맞네.
지적이 아니라 배려의 마음에 웃음 입꼬리가 자동 반사한다.
그의 아내, 안주인이 추울까 봐 침소를 따뜻하게 데워 놓은 게다.
이 보금자리로 집의 온기를 체감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다짐한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지키고, 충분히 누리면서 만끽할 줄 안다.” 이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의 몫으로 마음속에 새겨 본다.
마음의 평화는 네가 있는 곳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에 달려있다.
-작자 미상, 명언 -

홍헬렌송귀 작가
마음공감 코칭 & 심리상담센터장
학력 : 칼빈대학교대학원(심리상담치료학,상담학석사)
경력 : 현)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 이사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상담사/ 용인시 교육지원청 학생삼담
저서(공저) : [자존감요리편 10인10색마음요리2] [시니어강사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대한민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