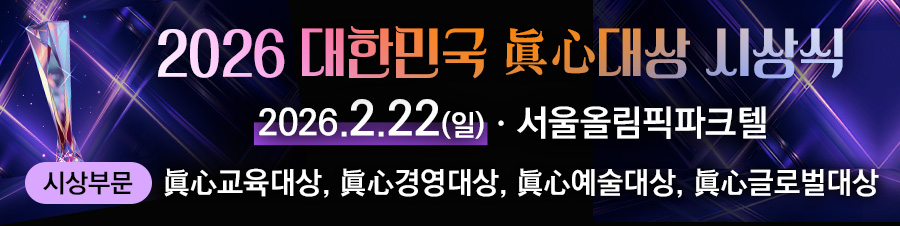인연
어느 날 갑자기 오래된 인연의 고리가 ‘툭’하고 끊긴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어갈 수 없어 겨우 버티던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다. 이유를 찾으려고 온종일 생각해 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마음에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니 답답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다 지난 과거일 뿐이다. 요즘은 신기하게도 오래전에 꿈꾸었던 일들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어찌 된 일일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꿈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그 시작은 소중한 인연으로부터다.
누구나 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랜 인연의 고리가 끊겼던 몇 달 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나는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라 결론 내렸다. 그때 만난 고마운 인연이 있다. 글쓰기를 지도해주시는 스승님이신데, 힘들고 지친 내가 쏟아내는 넋두리를 진심으로 들어 주셨고, 과거를 털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 그때 스승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떠오른다. “많이 힘드시죠? 그 힘든 마음의 소리를 한 번 글로 풀어 놓아 보세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글에는 마음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새로운 인생 3기의 삶에 희망을 주신 스승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수업을 하고, 가끔 직접 만나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나도 그분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천명이라는 세월을 넘어가는 동안,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인연이 되어 본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예전에 나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자살 예방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고픈 나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힘들 때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법,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의 말과 행동을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법 등을 알려주었다.
언젠가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한 적 있다. 처음에는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에 속상했지만, 나는 선생님이니까 아이가 들려주고픈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너 마음이 불편하구나? 뭐가 힘든지 선생님에게 말해볼래?”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대답하기 힘들면 그림으로 그려볼래?” 다시 한번 말을 건네자 아이는 책상에 웅크린 채 종이를 꼭꼭 숨겨가며 그림을 그렸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는 그 그림을 내게 선물이라며 전해주었다. 활짝 웃는 내 모습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삐뚤삐뚤한 색연필 선들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에 연필로 쓴 한 문장이 나를 울컥하게 했다. “마음이 예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통계에 의하면 꽤 많은 아이가 한 번쯤 자살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기억난다. 설문조사 질문란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칸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빼곡히 써 놓은 적이 있어, 놀란 적이 있다. 나는 학교 측에 집중 상담을 요청했고 몇 주 후, 전화가 왔다. 상담 선생님은 우울했던 그 학생이 많이 밝아졌다면서 기뻐하셨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다. 그때 그 학생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인연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는 인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고, 꼭 붙잡아야 할 소중한 인연도 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기도 하고,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이 좋은 기회를 가져오거나 위기를 모면하게도 한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누군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이름을 불러주는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라고 확신해 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경제신문]